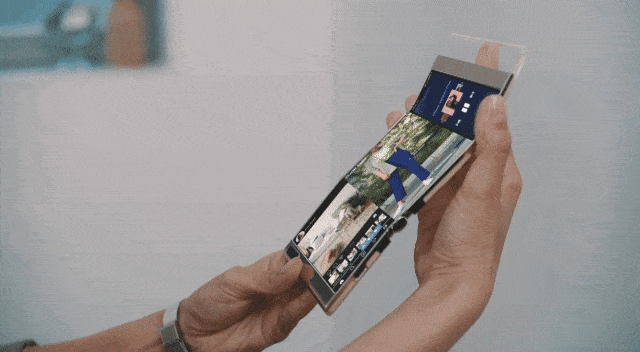‘평생을 정직하게 일한다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통설로는 그렇다. 36년간 길바닥을 누빈 62세의 세일즈맨 월리 로먼도 땀의 대가를 믿었지만 결말은 완전히 달랐다. 직장에서 해고되고 한때 총명했던 두 아들까지 타락해 희망을 잃었다. 로먼은 마지막으로 차를 과속으로 몰아 자살을 택한다. 가족에게 보험금을 남겨주기 위해서다.
1949년 2월10일, 뉴욕 모로스코 극장에서 처음 공연된 연극 ‘한 세일즈맨의 죽음(Death of a Salesman)의 줄거리다. 극의 끝자락 장례식에서 로먼의 아내는 ‘할부금 불입이 막 끝났는데 이제는 이 집에 살 사람이 없다!’고 울부짖는다. 아서 밀러가 쓴 이 극은 각종 비평가상을 휩쓸었다. 2년간의 장기공연은 물론 세 차례나 영화로 제작되고 29개국 언어로 번역돼 전세계의 수많은 극장에서 공연됐다. 우리나라 연극계에서도 대표적인 흥행 보증작으로 손꼽힌다.
‘세일즈맨의 죽음’이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이유는 보편성에 있다. 주인공인 로먼의 소시민적 삶과 행복ㆍ좌절은 1940년대 후반 미국 소시민을 넘어 전세계 보통사람들의 이야기였기에 지구촌의 공감을 얻었다. 죽음으로 끝 맺은 이 작품은 사회적으로 새로운 탄생을 이끌었다. 미국에서 하층민 지원과 교육, 각종 보장 같은 사회안전망이 확충된 데에도 이 극에서 제시한 물음이 깔려 있다. ‘열심히 살았다면 최소한의 보장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첫 공연 60년이 지난 오늘날은 예전보다 얼마나 나아졌나. ‘세일즈맨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본다. 한국의 처지는 연극보다도 훨씬 나쁘다. 62세까지의 노동과 내 집 마련이 부러운 사람이 한둘일까.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를 넘는 나라, 한국에 사는 수많은 로먼들의 어깨가 더욱 처져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