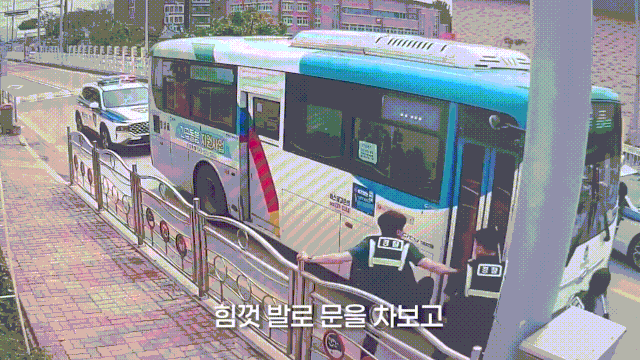그러나 국내외 물가동향은 결코 예사롭다고 할 수 없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1.3%로 2013년(1.3%)에 이어 2년 연속 바닥권을 맴돌았다. 중국에서도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5%를 기록하자 "중국의 디플레이션 위험이 커졌다"는 이코노미스트들의 진단이 잇따랐다. 미국 또한 지난해 12월 CPI가 0.8%로 전월 대비 0.4% 내려가면서 6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디플레이션 공포에 대응하는 각국 중앙은행의 대응도 각양각색이다. 일본은행은 저유가 기조를 적극 반영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의 1.7%에서 1.0%로 대폭 낮춰 잡았다. 영국중앙은행(BOE)의 경우 마크 카니 총재가 직접 TV에 출연해 "영국이 곧 디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말하며 경종을 울렸다. 지난해 12월 소비자 인플레이션이 0.5%에 그치자 극약 처방에 나선 것이다.
디플레이션은 경제적 재앙이다. 생산과 소비를 일거에 괴멸시킨다. 미국은 1929년 대공황 때 일자리 1,000만개가 사라지고 경제규모는 3분의2로 쪼그라들었다. 그런 재앙을 피하려면 물가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수적이다. 다만 소비공황의 공포를 부풀리기보다는 한국 경제를 디플레이션 안전지대로 만드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가계의 소비심리와 기업의 투자의지를 북돋아주는 쪽으로 집중돼야 하는 이유다. 소비자들도 '디플레이션 괴담'에 위축되지 말고 경기회복을 위해 소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