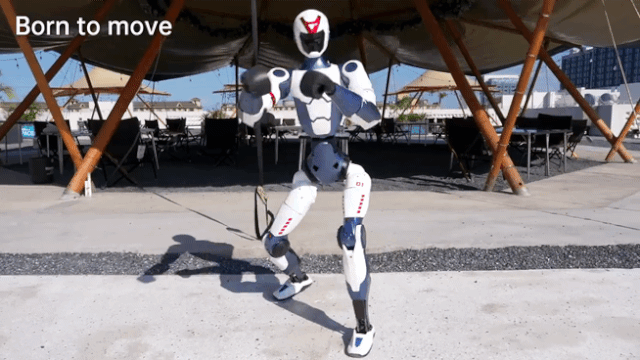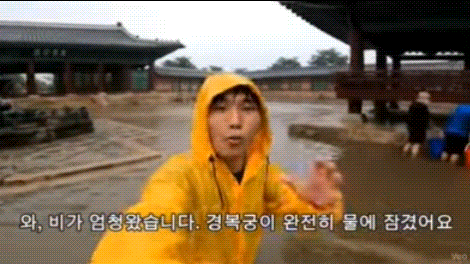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의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안타까운 상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도권에 사람과 돈, 모든 것이 모여드는 일극 체제가 몰고온 참담한 일이다. 이러한 실정은 문화계, 더 좁게는 박물관계를 비껴가지 않는다. 좀 더 나은 일자리나 생활 여건뿐 아니라 좀 더 윤택한 문화 생활을 위해서도 수도권에 거주하려는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의 중심성은 단연 두드러진다.
5월 초 서울 경복궁에서 열린 궁중 문화 축제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경기도 파주 소재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의 로고가 찍힌 에코백을 든 필자에게 일산에 산다는 시민이 느닷없는 질문을 던졌다. “왜 파주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지 않나요?” 순간 말문이 막혔던 필자는 5월 28일 파주관에서 열리는 아르헨티나 탱고 공연을 가까스로 떠올려 답했다. 2021년 경기 북부권에서 처음으로 파주에 국립박물관 시설이 들어선 것을 다행스럽게 여겨야 할까. 양질의 수준 높은 문화 향유에 대한 수요는 이제 전국 어디에서나 높다는 것을 새삼스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일극 체제가 초래하는 문화 불균형은 일극 체제를 확대재생산한다. 일자리뿐 아니라 좋은 전시를 보기 위해, 좋은 작품을 만나기 위해 서울로 가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정부가 지방 거점 도시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지역 분관을 설치하기 시작한 것이 1970년대 말이었다. 오늘날 광역 단위로 1~2개의 분관을 갖춰 모두 13곳의 지역 분관이 운영되는 것은 그 결과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민속박물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지방 분관 설치 계획을 발표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문화 인프라 구축이 나머지 대다수 지역에 초래한 문제점은 단순히 양적인 면에 그치지 않는다. 서울에는 전문 콘텐츠를 다루는 박물관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국립민속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립한글박물관 등 국립 기관에 더해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 등 시립 기관까지. 이에 비해 지방 거점 도시의 박물관 인프라와 콘텐츠는 매우 제한적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지방 분관들은 고고학과 미술사 분야를 중심 콘텐츠로 삼는 사실상의 전문 박물관이다. 선사시대와 고대의 문화상에 더해 전통 미술 문화의 규명·현양·전승에 주력하면서 한국의 문화 정체성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 다만 이러한 운영 방향이 지역 단위의 개별적인 문화 정체성을 모색하고 이를 지역 문화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21세기 박물관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 문화를 국가 공동체 문화의 하위 문화로만 인식하는 것은 개별 지역 문화의 다양한 빛깔과 잠재력에 주목하지 못하고 그 확장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지역의 총체적인 문화상을 보존·계승하고 창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식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유형 문화만이 아니라 무형 문화의 영역까지 살펴야 한다. 언어·문학·역사·민속·산업·미술·공예·음악 등 지역사회의 삼라만상을 짚어보며 어제와 오늘을 담아내고 나아가 미래를 전망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서야 비로소 박물관이 그 지역 문화뿐 아니라 장차 세계 문화의 창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꾼 지역 문화는 지역민과 한국인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 그 자부심은 지역뿐 아니라 한국과 세계 문화 발전의 원천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