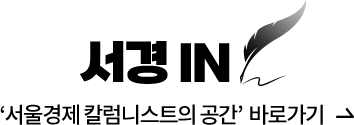‘빨리빨리’ 문화는 지금의 한국을 있게 한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한국 전쟁 직후 1인당 국민 소득이 100달러에 불과할 만큼 가난했던 국가는 빨리빨리 근성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며 현재 명목 GDP를 기준으로 세계 12위 규모의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반세기 만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모두 달성하며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던 단 기간의 고도성장의 배경에는 무엇이든 빨리빨리 해내고자 하는 한국인 특유의 근성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에서조차 빨리빨리가 강조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여 국가 발전의 근본 초석인 교육을 백 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큰 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부모들은 우리의 아이들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있다. 자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뒤처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하며, 어차피 배울 것이라면 빨리빨리 배워야 한다는 인식으로 선행학습에 열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빨리빨리 선행학습이 과연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일일까.
얼마 전, 4세 고시, 7세 고시란 말이 뉴스에 등장해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발달과 성장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자녀를 압박하는 일부 부모들의 잘못된 모습이 사회적 논란을 가져온 적이 있다. 치열한 경쟁사회를 살아가야 할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빨리빨리 교육을 실행한 것이겠지만, 아이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일이 ‘빨리빨리’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높은 선진국들을 보면, 빨리빨리 선행학습을 해서 배울 것을 미리 익히고 더 수준 높은 지식을 쌓기 위해 교육을 강제하는 우리의 교육과는 사뭇 다르다. 미국이나 스위스, 스웨덴 등의 아동교육은 강제적인 학습, 과도한 선행학습 대신 아이들의 창의력과 자율성을 강조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놀이가 중심이 된 교육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놀이 중심 교육, 사회성과 정서 발달에 중점을 둔 자율적인 교육 환경에서 아이들은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자신만의 반짝거리는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는다. 경쟁하는 법만을 배우는 우리의 아이들과 사회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며 성장하는 선진국의 아이들. 누가 더 행복하고, 누가 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일까.
미국의 영유아들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학습 방식인 몬테소리라든가 레지오 에밀리아, 발도르프 등의 교육 체계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며 자신의 재능을 발굴해 나간다. 천편일률적으로 입시에 필요한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이 보장되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며 자연스럽게 창의력을 증진할 수 있는 것이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만 7세 이전의 아동들에게 문자나 수학 등을 강제로 학습시키지 않는다. 대신 숲 유치원과 같이 자연 친화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자발적인 탐구의 기회를 가지며 의미 있는 경험을 쌓는다. 스웨덴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들에게 읽기, 쓰기에 대한 강요가 금지된다. 스웨덴의 모든 아동은 경제적 격차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지며 놀이를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선행학습을 강요하지 않고, 인성이나 사회성 발달, 자율과 창의력 증진 등에 중점을 둔 선진국의 아동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치며 구축된 교육 체계이다. 이들 국가의 부모들은 자녀의 관심사에 관심을 두고, 자녀의 창의력을 높일 수 있게끔 자율적인 학습을 선호한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 희생하며 투자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과도한 경쟁 속에 이른 나이부터 경쟁하는 법,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하는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성취의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교육 문화는 결코 아이들의 행복을 담보해 주지 못한다.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면, 도전을 통해 성장할 기회를 만들지 못한다. 부모의 조바심이나 희생은 결국 자녀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성급한 교육 문화로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도전과 실패의 경험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부모가 되어주는 것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