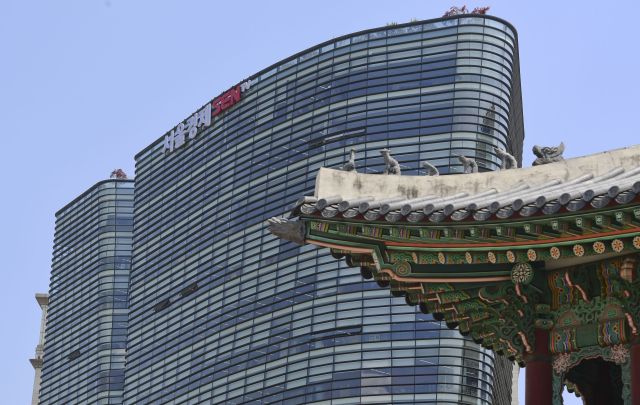대한민국 최초의 경제 정론지로 태어난 서울경제신문은 1960년 8월 1일 창간사에서 ‘경제의 안정·부흥을 통한 국민경제의 자립화’를 긴급한 과업으로 내걸었다. 경제개발이 막 움트기 시작할 즈음부터 본지가 걸어온 65년은 대한민국 경제가 경공업에서 중공업, 반도체로 대표되는 첨단 제조업까지 진화하는 발전사와 맥을 같이한다.
본지 창간호 1면 머리기사 제목은 ‘경제 9월 위기, 갈수록 심화-물가 15% 앙등·생산 3.8% 위축’이었다. 시작부터 우리 경제에 대한 경고를 아끼지 않았다. 창간호부터 100회분이 연달아 연재된 ‘경제백서’ 시리즈는 당시 주력 산업이며 수출 업종이던 광업부터 농업·금융·제조업까지 한국 경제의 실태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독자들을 사로잡았다.
창간 6년 만인 1966년 일본이 어업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한일 공동규제수역에서 물고기량을 부풀리려 했다는 ‘어획량 집계이상’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키며 한일 어업협정을 유리하게 이끈 계기가 됐다.
1960년대 초중반까지 국내 최고의 경제 엘리트들이 모였던 한국은행 조사부의 중간 실무자급 인력과 경제 부처 과장급들이 집필한 연재 칼럼 ‘경제교실’이 고시나 대기업 취직을 위한 필독서처럼 여겨졌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경제는 서울경제의 ‘경제칼럼’으로 공부했다”고 말했을 정도다.
1980년 신군부의 등장으로 본지와 독자들은 뜻하지 않은 비극을 겪었다. 명실상부 1등 경제지로 위상을 누리던 본지는 언론 통폐합 조치로 창간 20년 만에 종간 사태를 맞았다.
뼈아픈 좌절과 성장의 고통을 이기고 본지는 1988년 8월 1일 복간해 경제지의 판도를 바꿔놓는 새로운 시도를 이어간다. 베일에 가려진 재벌가의 인맥을 낱낱이 공개해 장안의 화제가 된 1990년의 ‘재벌과 가벌’ 시리즈,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 우리 경제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경보음을 울리고 대안을 제시했던 ‘경제를 살리자’ 시리즈를 통해 한국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새 미래를 제시했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전 국민 주식 갖기 운동’을 펼쳐 IMF 외환위기 조기 졸업을 도왔다.
2000년대 들어선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처하는 방향타 역할을 수행했다. 2007년 우리 경제를 재점검한 ‘외환위기 그후 10년’, 기후변화 협약의 현황과 미래 전망을 심층 분석한 ‘기후변화 시리즈’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2010년부터는 대표 행사인 ‘서울포럼’이 시작됐고 이후 ‘금융전략포럼’ ‘미래컨퍼런스’ ‘한반도경제포럼’ ‘에너지전략포럼’ 등을 통해 각 분야 인사들과 토론하고 산업 상황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로봇 등으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발맞춰 나아가고 있다. 2023년 ‘Big Shift 제조업 대전(大戰)’ 시리즈를 통해 해외 제조업 대전환 사례를 돌아봤고 올해 ‘다시, 코리아 미러클’을 통해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복합위기 속에서 첨단 제조업을 통한 돌파구를 강조했다.
지난달에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AI 기반 콘텐츠 솔루션을 전 세계에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