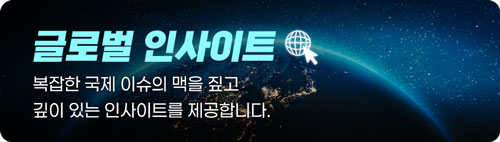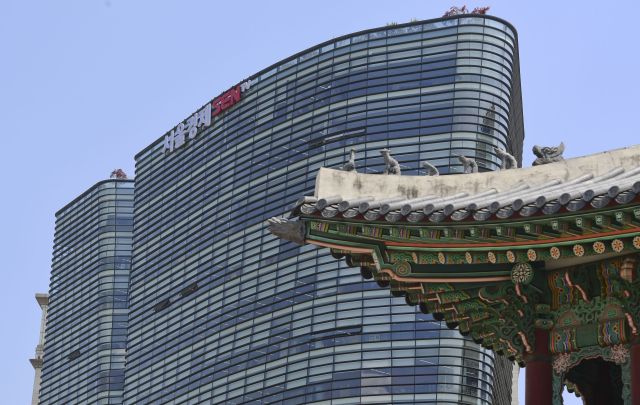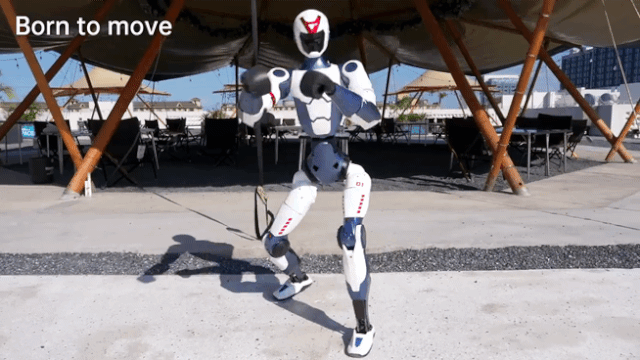서방 기업들이 철수한 틈을 타 중국 석유 기업들이 이라크 석유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히고 있다. 미국도 이라크 석유 시장 복귀 의지를 밝히면서 이라크가 미국 등 서방과 중국간 에너지 경쟁의 새로운 격전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지오-제이드, 유나이티드에너지그룹, 중만석유천연가스 등 석유 기업들은 지난해 이라크 탐사 라이선스 절반을 확보하는 등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2030년 하루 생산량을 현재의 두 배인 50만 배럴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설비와 인력도 대거 확충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국영 메이저 기업들과 달리 민영 또는 지방정부 산하 중견 업체로, 의사 결정 속도가 빠르고 서방 기업보다 비용 구조가 저렴하다. 메이저 기업들이 외면한 중소형 유전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중국 메이저인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유한공사(CNPC)가 이라크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중견·민영 기업들까지 진출하면서 중동 석유 시장에서 중국의 입지가 강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엑손모빌(미국), 셸(영국) 등 서방 메이저들이 정치·재정 리스크를 이유로 이라크에서 철수한 것이 중국 기업들의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이라크 정부가 하루 400만 배럴인 산유량을 2029년까지 600만 배럴로 50%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계약 구조를 고정 수수료제에서 수익 공유제로 바꾼 점도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석유 기업들의 점유율 확대는 OPEC+의 증산 결정과 맞물리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날 OPEC+는 9월 하루 54만7000배럴 증산을 결정하며 지난해 1월 시작된 자발적 감산을 전량(220만 배럴) 철회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30만 배럴 증산분까지 합치면 전 세계 수요의 2.4%에 해당하는 하루 250만 배럴이 추가 공급될 전망이다. OPEC+에는 이라크를 비롯해 OPEC 회원국과 러시아·카자흐스탄 등 10개 비(非)OPEC 산유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중국 석유 기업들은 이미 이라크 내 장기 계약을 확보하고 있어 OPEC+의 증산 기조 하에서 생산량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도 복귀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바심 쿠데어 이라크 석유부 차관은 지난달 21일 “엑손모빌이 웨스트 쿠르나1 유전 운영에서 손을 뗀 지 1년 만에 다시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해당 유전은 하루 55만 배럴 생산이 가능한 대형 유전으로 향후 이라크에서 미중간 에너지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른 서방 기업들도 이라크 내 투자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프랑스 토탈에너지는 지난해부터 270억 달러(약 37조 원) 규모의 복합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영국 BP도 키르쿠크 유전 재개발에 최대 250억 달러(약 35조 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서방 기업들의 복귀가 과거처럼 대규모 지분 확보를 통한 확장보다는, 중국 견제와 안정적 수익 확보를 겨냥한 제한적 복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