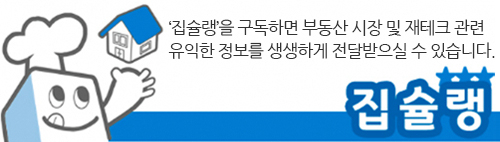6·27 대출 규제의 여파로 주택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신축 아파트 입주 시장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주택사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7로 7월의 95.8에서 20.1포인트 하락했다. 입주전망지수는 100을 밑돌면 입주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100을 넘으면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1.0포인트(117.1 → 76.1), 광역시 10.8포인트(91.0→80.2), 도 지역은 19.3포인트(91.5→72.2) 각각 하락했다. 6·27 대출 규제가 적용된 수도권의 하락폭이 더 컸다.
연구원은 지난해 시행된 분양 아파트 잔금 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 더해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전세 대출을 통한 잔금 충당 금지 등이 시행되며 원활한 입주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수요 억제를 중심으로 한 향후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가 주택사업자들의 부정적 전망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44.9포인트(121.2→76.3), 인천은 41.2포인트(111.5→70.3), 경기 36.9포인트 (118.7→81.8) 하락했다. 연구원은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70% 급감하는 등 고가 주택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서 특히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5대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이 4.1포인트(87.5→91.6) 올라 유일한 상승을 기록했다. 울산은 21.5포인트(100.0→78.5), 대구 15포인트(95.0→80.0), 광주 8.1포인트(86.6→78.5), 부산 6.5포인트(84.2→77.7) 하락했고 세종역시 17.8포인트(92.8→75.0) 하락했다. 대전의 입주전망지수 상승 이유에 대해 연구원은 대선 이후 지역 공약 이행 지연으로 세종 주택시장이 하락하면서 투자 수요 일부가 대전국가산업단지(예정)에 인접한 신규 공급 아파트로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도 지역 역시 충남이 30.0포인트(100.0→70.0) 하락하고 전북은 27.3포인트(100.0→72.7), 경남 25.0포인트(100.0→75.0), 전남 24.3포인트(90.9→66.6) 각각 하락하며 비(非)수도권 지역 역시 부정적 전망이 확산됐다. 주택업계에서는 6·27 대출 규제가 아파트 입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일으켜 결국 민간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7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3.9%로, 6월 대비 3.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6%포인트(80.8%→83.4%) 상승했고, 5대 광역시는 7.0%포인트(53.8%→60.8%), 기타 지역도 0.1%포인트(58.7%→58.8%) 상승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1.4%포인트(87.7%→89.1%), 인천·경기권 3.3%포인트(77.3%→80.6%) 상승했다.
미입주 원인은 잔금대출미확보(38.5%), 기존주택매각지연(32.7%), 세입자미확보(17.3%), 분양권매도지연(1.9%)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잔금대출미확보는 7월 조사의 27.1%에서 38.5%로 상승하며 7월 조사에서 37.5%로 가장 비중이 높았던 기존주택매각지연을 앞질렀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미입주 원인으로 잔금대출미확보 비중이 급증하며 가장 큰 입주 장애 요인으로 떠올랐다”며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자금 경색이 수분양자들의 입주를 직접 제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대출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입주 포기 증가로 인한 미분양 장기화와 사업자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금융·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